오늘 페북을 보다보니 성심당 이야기 소개되었길래 여기에 공유해 본다. 힘든 세상이지만 온정과 따뜻한 마을을 가진 사람이 생각외로 많고 그 분들로 인해서 세상은 좀 더 살맛나는 것 같다.
성심당 직원이 고객을 배려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400원이 없어서 단팥빵을 살수없었던 어느 아주머니에게 직원이 자기돈으로 모자란 돈을 채워 단팥빵을 드렸다는 이야기
페친은 아니지만 정은영님의 페북에 있는 글을 옮겨왔다.
“제가 계산대에서 근무하는데 어느 날 한 아주머니가 단팥빵 하나를 고르고 800원을 내셨다. 1200원이니 400원을 더 내야 한다고 옆 동료가 얘기하자 그 분은 머뭇거리다 빵을 놓고 말없이 돌아섰다. 그 분의 굳은 살 박힌 손과 돌아서 나가는 모습을 본 순간 이 자리에 우리 사장님이 계셨다면 어땠을까, 분명 그냥 보내지 않으셨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그 순간 호주머니를 뒤져서 500원짜리 동전을 꺼내 대신 돈을 내고 달려가서 그 분에게 단팥빵 한 개를 쥐어드렸다. 우리 사장님이라면 분명 그렇게 하셨을 테니까 나도 그 분을 외면할 수 없었다…”
존 스타인벡의 분노의 포도에 나오는 1센트 캔디 이야기
이 미담에 대해서 비슷하게 힘든 세상살이 속에서도 인정은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존 스타인 벡의 “분노의 포도”에 나오는 1센트짜리 캔디 이야기가 소개되었길래 그 이야기도 소개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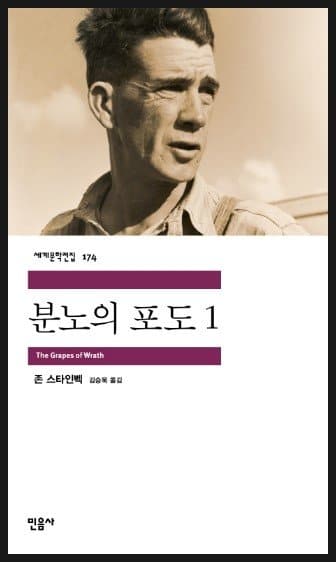
배경을 살펴 보자
존 스타인 벡의 분노의 포도는 아마도 학창시절에 한번 정도 읽었을 것이다. 워낙 유명한 소설이니.. 아니면 혈기 왕성한 대학시절에 읽었을 수도 있겠다. 사회 문제 의식에 눈을 떴다면 이런 소설쯤은 읽는 게 수순이 아닐까? 아님 말고
서실 이 책은 지주, 은행, 경찰의 노동자 탄압을 고발하는 내용이 많아 발표된 1939년 당시에는 금서로 지정될 정도였다. 그렇지만 지금은 미국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많이 읽히는 작품이라고 한다. – 위키백과 인용
필자도 언제 읽었는지 가물가물하다. 다 잊혀져서 희미한 줄거리만 남았다.
당시의 배경에 대해서 “분노의 포도, 그리고 1센트짜리 캔디”의 내용을 조금 수정해 재정리 해보았다.
미국 중부 오클라마주의 수만명의 소작농들은 은행에 땅을 빼앗기고 삶의 터전을 잃었다. 그들은 고민끝에 포도와 오렌지가 가득하다는 캘리포니아로 무작정 떠나기로 한다.

대개 중고차 상인에게 속아서 산 고물 트럭에 남루한 가재도구와 지친 식구들을 싣고, 몇푼 안되는 여비를 가지고 긴 여행을 떠나는 소작농들의 행렬이 긴 66번 국도를 메우다시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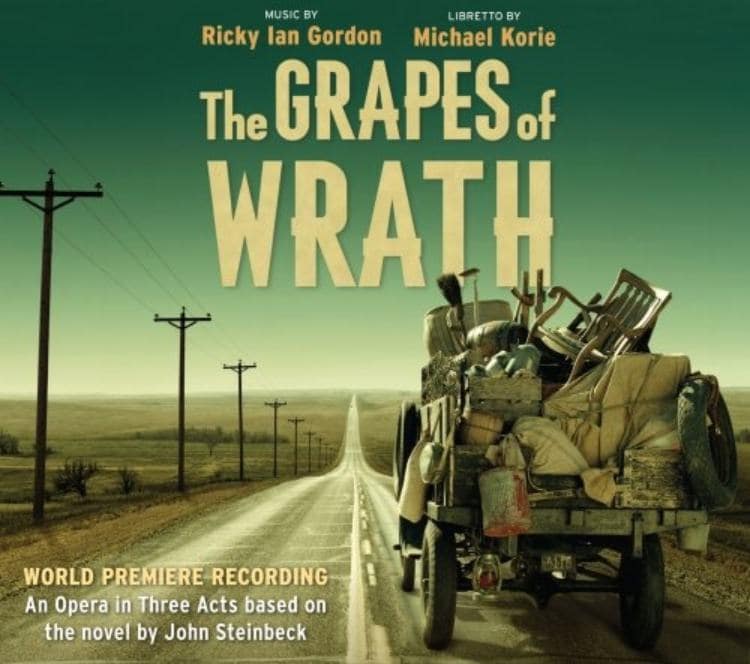
이러한 행렬중에는 조드 일가도 포함되었었다. 조드 일가는 도로변 휴게소에 차를 세우고 물과 빵을 구한다. 당연히 휴게소 주인 내외는 이들이 반갑지 않다.
분노의 포도 내용 인용 – 1센트 캔디
남자가 묻는다. “아주머니, 물 좀 얻을 수 있을까요?”
짜증스러운 그림자가 메이의 얼굴에 살짝 스쳐 간다. “네, 어서 쓰세요.”
그녀가 어깨 너머로 가볍게 말한다. 어디, 저 호스를 잘 지켜보아야지. 그녀는 남자가 천천히 라디에이터 캡을 비틀고 호스를 그 안에 넣는 동안 그를 지켜보고 있다.
황갈색 머리 빛깔의 여자 하나가 차 안에서 소리친다.
“혹시 그걸 여기서 구할 수 없는지 알아보세요.”
남자가 물 호스를 빼내고 라디에이터 캡을 다시 막는다. 아이들이 그로부터 호스를 받아 위쪽으로 치켜들고 벌떡거리며 물을 들이킨다. 남자가 때 묻은 시커먼 모자를 벗어 들고 묘하게 굽실대는 태도를 문간에 다가선다.
“혹시 빵을 한 조각 잘라서 팔아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주머니?”
메이가 말한다. “여기는 식료품점이 아닌데요, 우리는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파는 빵밖에 없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아주머니.” 그의 굽실대는 태도는 집요하다.
“우리는 빵을 사야겠는데 아무데를 가도 어디 살 수가 있어야지요.”
“빵을 팔면 우리는 장사를 못 하는데요.”
메이의 말투가 좀 더듬거리는 듯하다.
“너무 배가 고파 그럽니다, 아주머니.” 남자가 말한다.
“샌드위치를 사시면 되잖아요? 우리 집 샌드위치나 햄버거는 아주 훌륭한데요.”
“그럴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10센트를 가지고 온 식구가 다 요기를 해야 할 형편입니다.”
그러더니 그는 좀 난처한 듯이 말한다. “돈이 없어서 그럽니다.”
메이가 말한다. “단돈 10센트 가지고는 빵을 사실 수 없어요. 우리 집에는 15센트짜리 빵밖에 없는데요.”
그녀 등 뒤에서 앨이 볼멘소리로 말한다.
“제기랄, 주어 버리지 무얼 그래.”
“그럼, 빵 배달차가 오기도 전에 빵이 다 떨어지라고?”
“떨어지면 떨어졌지 뭐.”
앨이 말한다. 그러더니 그는 시무룩하게 자기가 뒤섞고 있던 감자 샐러드를 내려다본다. 메이가 포동포동한 어깨를 으쓱 추켜 보이더니 앨의 말이 못마땅하다는 것에 동조라도 해달라는 듯이 트럭 운전사들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녀는 미닫이문을 열어 준다. 밖의 남자가 들어오면서 땀 냄새를 독하게 풍긴다. 그 뒤에 아이들이 따라들어 와서는 곧장 과자상자 쪽으로 달려가서 안을 들여다본다.
먹고 싶다는 욕심이나 희망으로가 아니라 이런 물건도 있느냐는 듯 의아해 들여다보는 것이다. 두 아이가 서로 몸집이나 얼굴이 비슷하게 생겼다. 한 아이가 한쪽 발톱으로 다른 한쪽의 발목을 긁는다.
또 한 아이가 무언가 가만가만 소곤거린다. 그러더니 그들은 팔뚝을 쭉 뻗는다. 작업복 속의 호주머니 안에 움켜 쥔 그들의 주먹이 얇은 청색 천에 비친다.
메이는 서랍을 열고 초 종이로 길게 말아 쌓아놓은 빵을 꺼낸다.
“이건 15센트짜리 빵이에요.”
남자는 모자를 머리에 다시 올려놓는다. 끈덕지게도 굽실대면서 그가 대답한다.
“혹시 거기에서 10센트 어치만큼만 잘라서 파실 수 없을까요?”
앨이 으르렁대며 말한다. “아이 참 무얼 그래, 메이. 그냥 주라니까.”
남자가 앨 쪽을 돌아본다. “아닙니다, 그저 10센트 어치만 샀으면 좋겠습니다요. 돈이 너무 빠듯해서 그럽니다. 캘리포니아까지 가려니까, 원.”
메이가 단념하듯 말한다. “10센트만 내고 가져가세요.”
“그럼 억지로 빼앗아 가는 셈이 되는데요, 아주머니.”
“가져가세요. 앨이 드리라고 하잖아요.”
그녀는 초 종이로 산 빵을 카운터로 민다. 남자는 뒤 포켓 깊은 곳에서 가죽지갑을 꺼낸다. 끈을 풀더니 지갑을 연다. 지갑은 은전과 때 묻은 지폐로 묵직하다.
“너무 떼를 써서 우습게 되었습니다. 그가 변명한다. 아직도 갈 길이 수천 마일이나 남았는데 이 노자가 안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손가락을 지갑 안에 집어넣어 10센트짜리 동전을 찾아 꺼낸다. 카운터에 내놓자 1센트짜리가 하나 같이 붙어 나온다.
그는 그 1센트짜리를 지갑 안에 도로 집어넣으려다가 과자 상자 앞에 얼어붙듯 서있는 두 아이들에게 시선이 간다. 그는 천천히 아이들 쪽으로 다가간다. 그는 상자 안에 있는 기다란 줄무늬 박하 과자를 손가락을 가리킨다.
“아주머니, 저건 1센트짜리 과잡니까?”
메이가 몸을 굽혀 들여다보았다. “어느 거요?”
“여기 저 줄친 것 말입니다.”
아이들이 고개를 들어 그녀를 쳐다보면서 숨을 죽인다. 그들의 입이 반쯤 벌어진다. 거의 벗다시피 하고 있는 그들 몸뚱어리는 뻣뻣해 있다.
“아, 그거요? 아녜요, 그건 1센트에 두 개씩이에요.”
“그럼 아주머니, 두 개만 주세요.”
그는 동전 한 닢을 조심스레 카운터에 내놓는다. 아이들은 참았던 숨을 가만히 몰아쉰다. 메이가 큰 과자를 꺼낸다. “가져가서 먹어라.” 남자가 말한다.
그들은 조마조마하게 손을 뻗어 과자를 하나씩 집더니, 과자를 옆구리 아래에 든 채 시선조차 보내지 않는다. 그리고 서로 쳐다보면서 어쩔 줄을 모르고 쭈뼛거리며 미소를 짓는다.
“아주머니, 감사합니다.”
남자는 빵을 집어 들고 문밖으로 나간다. 아이들도 뻣뻣하게 그 뒤를 따라 나간다. 빨간 줄무늬가 있는 과자를 다리에 꼭 눌러 쥐고 있다. 그들은 다람쥐처럼 차의 앞좌석에 뛰어오르더니 다시 짐꾸러미 위로 올라가 보이지 않게 된다.
남자가 차에 오르더니 발동을 건다. 모터가 부르릉거리고 푸르스름한 연기가 기름 냄새를 풍기며 피어오르더니 그 고물 내쉬 차는 이내 국도 위에 올라서서 다시 서쪽으로 제 갈 길을 가버린다. 음식점 안에서는 트럭 운전사들과 메이와 앨이 그들 뒤를 응시하고 있었다.
“아까 그 과자는 한 개에 5센트짜리였지?” 빌이 말한다.
“무슨 상관이세요.” 메이가 사납게 말했다.
“그건 하나에 5센트짜리였다고.” 빌이 또 빈정거린다.
“자, 이젠 그만 가야겠어.” 또 한 남자가 말한다. “시간이 늦겠어.”
그들은 호주머니 안에 손을 집어넣는다. 빌이 카운터 위에 동전을 꺼내 놓는다. 다른 남자가 그걸 쳐다보더니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동전을 꺼낸다. 그들은 몸을 돌려 문간 쪽으로 향한다.
“잘 있어.” 빌이 말한다.
메이가 소리를 지른다. “잠깐 기다리세요. 잔돈 가져가셔야죠.”
“예끼, 뚱딴지같은 소리!” 빌이 소리를 지르고 문소리가 꽝 하고 들린다.
메이는 그들이 커다란 트럭에 들어가는 것을 지켜본다. 트럭이 낮은 기어로 털털거리고 떠나는 것을 지켜보면서, 속력을 올리며 기어가 바퀴에 걸려 가는 소리를 듣고 있다.
그녀가 가만히 부른다. “앨!”
그는 또닥거리고 있던 햄버거로부터 고개를 든다. “왜 그래?”
“저기 좀 보라고.” 그녀는 커피 잔 옆에 있는 동전을 가리킨다. 50센트짜리 두 개가 놓여 있다. 앨이 다가와서 쳐다본다. 그는 이내 돌아가서 일을 계속한다.
“트럭 운전사들은 역시 달라.” 메이가 대견하다는 듯이 말한다. 그런 사람들이 다녀간 다음에 ‘똥 묻은 발꿈치’들이 온단 말이야.

